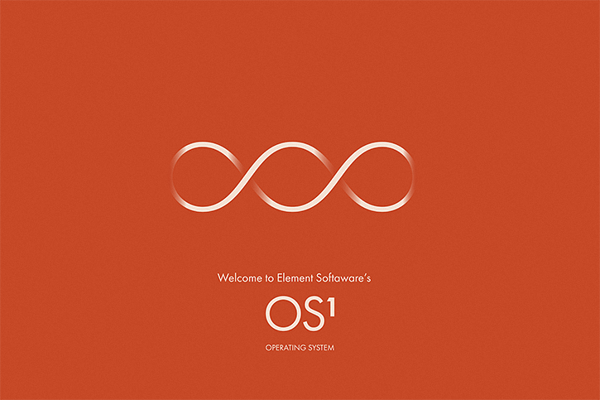
생성형 AI에 대한 소식을 듣다 든 생각이다.
앞으로 AI 툴을 얼마나 익숙하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 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될지, 아니면 반대로 AI가 그 격차를 좁히게 될지를 생각해 보았다.
AI 기술 발전의 표면적 목표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지만 내가 몇 차례 AI 사용을 통해 얻은 경험은 ‘꼭 그렇지 많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쪽에 가까웠다. AI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거나 생산할때에는 무턱대고 결괏값을 유도하기보다는 AI가 내 의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명확한 가이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마다 같은 도구를 가지고도 경험의 질이 유의미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질문을 얼마나 똑똑하게 하느냐’가 중요했다.
인간과의 소통에서도 질문을 잘하기란 간단치 않다. 질문의 함의가 얼마나 고차원 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답변자가 질문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질문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 답변 자체의 질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질문과 답변이라는 구조를 수직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모르니까 멍청하게 물을 수밖에 없고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답변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받아들이기 쉽고, 실제로도 그런 구도를 이루는 경향이 많지만 이 또한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 내 생각에 오히려 질문과 답변은 수평적일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내놓는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등신같이 물어놓고 왜 못 알아듣냐며 한숨 쉬는 사람들이 꼭 있음.)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처럼 질문이 흐리멍덩하면 AI도 중구난방식 답변을 하거나, 아예 엉뚱한 정보를 뱉어낸다. 분명 기술 발전이 거듭되면서 점차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AI가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물의 질이라는 것에 상한선이 있을 수는 없다. 모두 같은 조건이라면 분명 어떠한 변수가 차이를 만들 것이다. 당연히 질문이 그 변수가 될 테고. 결국 당분간은 질문을 잘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나는 AI의 활용 능력이 사람끼리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양상이 다른 격차를 만든다는 쪽으로 판단이 기운다. 그럼에도 확신할 수는 없다. 10년 전, ‘설마’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현실이 되어버렸고 AI 전문가들이 내놓는 결실은 매번 내 상상 밖의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단상 > 배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0) | 2024.12.15 |
|---|---|
| 갑자기 생긴 궁금증 (0) | 2024.11.16 |
| 책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방법 (0) | 2024.06.27 |
| 0.1%의 삶 (1) | 2024.01.12 |
| 아주 우스운 꼴 (0) | 2023.10.08 |
